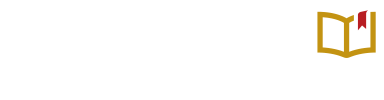하버드대학교에는 ‘Science and Cooking(요리와 과학)’이라는 강좌가 있다. 공과대학(School of Engineering and Applied Sciences)에서 개설하는 데 학부에서는 교양강좌(Science and Cooking:From Haute Cuisine to the Science of Soft Matter)로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그런 인기를 반영해 요즘은 비슷한 형태의 강의 시리즈가 일반인들을 위해서도 운영되고 있다.
지난 해 영국의 요리 전문지 <레스토랑>에서 선정한 ‘세계 50대 음식점’에 1위로 뽑힌 스페인의 ‘엘 세예르 데 칸 로카(El Coller De Can Roca)’의 조르디 로카(Jordi Roca)를 비롯해 백악관의 Pastry Chef인 빌 요시스(Bill Yosses), 엘 불리 재단(elBulli Foundation)의 페란 아드리아(Ferran Adria) 등 세계적 셰프들과 요리 전문가 및 저자들이 ‘과학과 요리(Science and Cooking)’, ‘점성:디저트=풍미+식감(Elasticity:Dessert=Flavor+Texture)’, ‘발효(Fermentation:When Rotten Goes Right)’ 등을 주제로 과학과 요리를 접목시켰다(http://www.seas.harvard.edu/cooking). 그리고 이 같은 참신한 방법으로 응용 물리학과 공학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요리도 요리지만, 필자는 어떻게 과학과 요리를 접목시키고 교육하는지가 궁금해 강의를 꼭 들어보고 싶었으나 시간이 맞지 않았다(강의 동영상은 유트브로 모두 시청 가능- http://www.youtube.com/watch?v=dr1O3xQY8VA 등). 그러다가 보스턴에도 분자요리와 같은 과학적 방법으로 요리를 하는 전문가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바로 보스톤 최고급 프랑스 레스토랑 레스팔리에(L’Espalier)에서 패스츄리 셰프(Pastry Chef)로 일 하던 김지호 씨다.
보스턴 시내 최고급 레스토랑에 한국인 Pastry Chef가 있다는 사실 만도 자랑스러웠지만 이후에도 그의 행보는 계속 빛났다. 영국 최고의 요리사, 고든 램지(Gordon Ramsay)가 미국에 처음 세운 ‘Gordon Ramsay at the London NYC’에서 Pastry Chef를 맡더니 올해 4월 초 뉴욕 시내 미드타운에 새로 문을 연 ‘Beautique’라는 고급 레스토랑에 다른 유명 요리사들과 함께 Pastry Chef로 당당히 합류한 것이다. 하지만 김 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요리를 배운 후 보스턴에 이민 간 경우다. 그렇다면 지금의 성공이 있기까지 그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언어 때문에 백인 요리사들의 협조를 얻는데 많이 힘드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왜 미국에 오게 되셨나요?
원래 제가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일했었어요. 그런데 한 10년 정도 일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지루하기도 하고. 한국에선 사람들이 좀 여유롭잖아요. 일 하고 그 외의 나머지 시간들은 모두 개인 시간이잖아요. 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늘 일 끝나면 놀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다른 재미있는 걸 찾아보고 싶어서 영어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지나가다 그냥 영어학원에 등록했어요. 공부라도 해볼까 해서. 제가 공부를 워낙 안했어요. 정말 안했거든요. 공부의 ‘공’자랑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았는데, 막상 시작을 하니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다 영어로 된 요리책을 사서 보게 됐어요. 마치 한국의 백과사전 같이 큰 요리책인데, 처음에 그림만 보고 샀거든요. 보기 쉬울 줄 알고. 거금을 들여서 샀는데, 책을 보니까 깨알 같은 글씨가 완전 백과사전이었어요. 그걸로 영어 공부를 시작하게 됐죠. 베이킹도 그 전까지는 직장에서 윗사람들에게 말로만 배워 오던 걸로 했는데, 그 책을 읽기 시작하다 보니 화학적이거나 과학적인 모든 그런 원리들이 뒷받침해주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셰프님의 과학적인 요리법이 시작된 거군요.
네, 처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베이킹 사이언스를 알게 되고, 이스트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거를 다 그 책을 통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외국에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아보니까 제일 쉽게 이민 갈 수 있는 데가 미국이더라고요. 자격이 돼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오게 된거죠.
그럼 꽤 나이가 들어서 미국에 오셨는데 어렵지 않으셨나요?
미국에 오자마자 매우 어려웠죠. 학원에서 아무리 영어를 배웠다고 한들 여기 와서 막상 해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엔 더 했죠. 체계적으로 영어를 공부한 적도 없고. 어쨌든 몇 군데 호텔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10년 정도 일을 한 경험도 있고,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도 만들어 가고 준비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직장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버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시기와 질투도 있었고…. 아무래도 백인 위주니까요.

‘L’Espalier‘ 레스토랑에는 Pastry Chef로 몇 분을 거느리고 계신가요?
8명 있어요. 그 중에 동양인은 있다 없다 하는데, 지금은 저 혼자고 다 백인입니다. 다른 데서는 제가 뭘 하자고 하면, 아예 저하고 일을 하지 않았어요. 또 그 친구들이 어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게 힘들어서 누가 텃세를 부릴 일도 없고, 사장 바로 아래서 혼자서 일을 하는 작은 식당에서 일한 적도 있어요. 제가 열심히 일 하면 주인이 정말 흐뭇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배우게 됐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빵을 배우려고 영어도 많이 배우고, 일 끝나고 나면 함께 일 하는 사람들에게 회화도 배우고, 음식도 배우고. 또 저는 혼자서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해요. 해박한 지식을 쌓는 책은 잘 안 읽지만 디저트나 베이킹 관련 책들은 정말 쌓아놓고 읽었어요. 집에 거의 모든 잡지가 다 있을 정도니까요. 그렇게 하나 둘 섭렵 하다 보니 일 하는 쪽으로 자신이 생겨서 여기까지 오게 된거죠. 운도 따랐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독특한 경력을 갖게 되셨겠어요.
그렇죠. 미국에 와서 정착하느라 어려움과 실패도 겪으면서 여기 저기 다녀보고, 벤치마킹도 하다 보니 나름대로 색깔도 갖게 되고, 아이디어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2009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보스턴에서 스타 셰프 ‘라이징 스타’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인터넷에 나오고 그러는 게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진짜 그렇게 됐어요(웃음).
어떤 음식을 만들었나요?
심사위원들이 보스턴 시내를 다 돌면서 저녁을 먹고 다녔어요. 몇 달 동안 왔다갔다 하면서 점수를 매기고 그랬는데, 디저트 같은 걸 약간 다른 컨셉트로 해주면 좋아하더라고요. 티라미수도 늘 보는 모양이 아닌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 냈는데 그걸 인정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맛’이라는 건 좀 주관적이지 않나요?
제가 L’Espalier에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화학 공부를 더 했어요. 그래서 그 방면으로는 보스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꽤 알아주는 실력을 갖고 있어요. 그건 자부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음식을 만드는데 쓰는 화학재가 30가지가 넘어요. 젤리를 만드는 젤리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도 15가지 종류가 다 달라요. 일반적으로 요리하는 사람들은 젤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꼭 젤라틴만 쓰거든요. 그런데 젤라틴의 단점도 있으니까 그런 단점을 다른 걸로 보완해줄 수 있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독학을 해서 차별화할 수 있으니까 그걸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분자 요리 같은 건가요?
그런 느낌이죠. 초반에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어 계란 흰자는 90%의 수분과 10%의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면 단백질을 따로 사가지고 90%의 액체와 단백질 10%만 있으면 모든 종류의 흰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딸기 계란 흰자도 만들 수 있고, 딸기도 주성분은 수분이잖아요. 계란은 거품을 내면 거품이 나거든요. 사람들은 음식의 식감을 중요시하잖아요. 맥주를 마셔도 항상 위에 일정량의 거품이 있어야지 그 느낌이 좋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거품을 좋아하잖아요. 무스 같은 걸 만들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품들을 디저트에 섞어봐야지 하고 시작한 게 딸기와 계란을 섞어 만든 디저트에요. 또 미국에는 채식주의자들이 있는데 계란대용식이라고 콩단백질로 흰자를 대신해서 만든 게 있어요. 그럼 딸기에다가 콩단백질을 넣으면 계란 흰자 대용이 되는 겁니다. 그걸 또 거품을 내면 거품이 나요. 그런 걸 응용한 디저트도 있어요. 제가 연구하고 찾아보고 하면서 스스로 개발한 건 아니지만 원리를 공부해서 만들어낸 거죠.
어떻게 찾으셨어요?
인터넷으로 주로 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처음에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게 언제였나요?
34~35살? 아직도 영어는 잘 못 해요. 근데 공부를 하게 되면 단어는 다 몰라도 읽다 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미역 같은 해조류에서 채취한 자연산 케미칼이 있는데 칼슘에 반응이 있어요. 미역 같은 게 딱딱하게 젤리같이 굳어있는 원리가 그 성분들이 바다 속에서 응고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섞어서 과일 주 칼슘 같은 걸 섞어서 떨어뜨리면 막을 형성해요. 일반 사람들도 많이 하는데, 막을 형성해서 공 같이 되고, 그 안에는 주스가 들어가요. 지금은 여기저기 너도나도 하는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또 그게 100%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다 보면 꼭 문제가 생겨요.
그럼 머리 아프지 않으세요?
발명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에는 이런 것도 했었어요. 초콜릿을 원통으로 실린더로 만들어서 그 속에 마시멜로를 채운 다음 접시 위에 올려서 차를 같이 가지고 나가요. 그 차를 부으면 초콜릿이 녹으면서 마시멜로가 나와요. 그리고 무스 같은 걸 길 모양으로 파서 접시 위에 일 자로 놓고 그 안에 체리나 사과, 견과류 같은 것으로 채워놓고 나가서 손님이 그걸 깨뜨리면 안에 있는 게 쭉쭉 굴러 나오는 그런 것들. 얼마 전에는 또 타이어 가게에서 우연히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용기에 구멍을 내서 타이어 밸브를 꽂은 다음 탄산 가스를 넣는 식으로 디저트를 만들어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손님이 굉장히 다양한 알레르기가 있는 분이셨는데 인공적으로 단 걸 먹을 수가 없는 분이여서 어떻게할까 고민하다가 블루베리를 사서 그 안에다 탄산 가스를 집어 넣었어요. 탄산은 안에서 공기를 밀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블루베리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 나오면서 탄산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씹을 때 톡 쏘게 되어요. 한국 음식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발효가 된 물김치나 깍두기 같은 거 먹으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게 디저트를 만들어 드렸더니 그 손님이 자기는 설탕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탄산 음료를 한 번도 못 마셔 봤대요. 그런데 제 덕분에 처음으로 탄산이라는 것의 느낌을 받아 보셨다고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다음 호에 계속)

인터뷰 양영은
현재 <KBS 뉴스타임> 앵커. KBS 인터넷 인터뷰 ‘선물’ 진행. 2008년까지 <KBS 뉴스타임> 기자 겸 앵커로 활약하다 유학길에 올라, 2010년 미국 MIT Sloan School of Management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하버드 웨더헤드 국제문제연구소(Weatherhead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에서 펠로우로 1년간 연구 활동을 하며, 하버드와 MIT를 비롯해 보스턴 지역의 다양한 석학들을 인터뷰했다. 창의적 리더십과 경영 관련 교육, 동물 보호에 관심이 많다.
e-mail: ye_yang@sloan.mit.edu
twitter: @youngeun_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