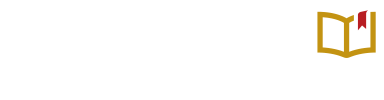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까지 더하면 최고 65%에 달한다. OECD 평균 최고세율인 26.3%의 2배 이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상속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1%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상속세 대신 물려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 세금을 과세해야 100년 기업을 배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Editor 도경재

최고 65%에 달하는 현재의 국내 상속세율은 2000년에 제정된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상속세율이 높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세원이 투명하지 않았던 지난 시절, 어느 정도 탈세가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 세율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무당국이 기업의 자금 출처와 이동을 환하게 알 수 있는 오늘날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가경쟁력 좌우하는 가업승계제도
우리와는 달리 100년 기업을 자랑하는 선진국들은 상속세가 없거나 파격적인 공제 혜택으로 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지구촌의 많은 나라가 아예 상속세를 폐지하여, 가업승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는 세계 최초로 1972년 상속·증여세를 폐지했고, 호주도 198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했다. 스웨덴 역시 2005년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했고, 홍콩과 싱가포르 등에도 상속세가 없다.
이들 나라에서는 기업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내지 않고, 기업을 매각할 때 얻는 자본이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구조를 택했다. 그로 인해 기업들의 조세회피 요인이 줄어들고, 가족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분석한다.
가업승계와 관련된 제도의 차이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나라경제와 국가경쟁력과 관계된다. 2016년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와 글로벌금융회사 CLSA는 아시아기업 1,200개를 대상으로 이사회 독립성, 공시 투명성, 규제 환경 등 50여 개의 기준을 적용해 기업지배구조의 건전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일본은 3위로 평가받은 반면, 한국은 8위에 머물렀다. 조사대상국이 11개국임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최하위권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지난 2010년 이후 단 한차례도 8위를 벗어난 적이 없다는 점이 더욱 충격적이다.
2016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기업지배구조 연례 평가보고서에서 한국은 61개국 가운데 29위로, 후진적인 평가를 벗어나지 못했다. 2016년 한국이 받은 평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순위다. 평가의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인 '경영 관행' 부문에서는 최하위였고, '기업윤리실천'과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 등에서도 각각 58위와 60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지원센터 상무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후진적 기업지배구조는 국가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에 대한 저평가 기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대·엄격한 독일의 가업승계
지난 2월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검에 의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부회장은 지주회사 전환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경영권 승계에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며 최순실 측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많은 대기업 총수의 2, 3세들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법과 위법을 오가며 불안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등 편법적인 불공정 거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국과 동일하게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인 독일의 경우, 상속세가 무서워 가업승계에 고민을 하거나 불법 또는 탈법을 저지르는 기업인들은 없다. 이는 지난 2009년, 가업승계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독일의 상속세개혁법이 발효되었기 때문이다.
독일의 가업승계지원은 기업규모는 물론 업종 제한도 없다. 단지 승계 후 경영기간과 고용유지 규모에 따라 상속세의 85~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85%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승계 후 최소 5년간 기업을 경영하되, 비사업용 자산 비율이 전체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용유지이다.
100% 면제를 위해서는 가업승계 후 최소 7년간 사업을 이어가야 한다. 또 승계 받는 자산 중 비사업용 자산 비율이 10%를 넘으면 안 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이러한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혜택 받은 만큼의 세금 감면액을 토해내야 한다.
이는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업 경쟁력을 대물림한다는 확고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혜택을 받은 기업인은 고용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사회적 책임을 진다. 또 대주주라 하더라도 멋대로 회사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견제수단도 마련되어 있다.
1899년에 설립된 명품 가전업체 밀레는 100% 가족 소유 기업이지만, 100년 넘는 역사에도 탄탄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지분의 49%는 진칸 가문이, 51%는 밀레 가문이 보유하고 4대째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가업승계 혜택을 받는 만큼 회장에 오르기 위한 절차는 매우 엄격하다. 두 가문 출신이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영학이나 공학 등을 전공해 평균 B학점 이상의 성적으로 졸업해야 한다. 또 한 개 이상 외국어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회사에서 4년 이상 경력을 쌓은 뒤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본 요건을 채우면 본격적으로 검증절차에 돌입한다. 테스트는 가문과 전혀 관련이 없는 6명의 심사위원들에게 하루 동안 강도 높은 면접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이를 통과하면 밀레 가문과 진칸 가문 60명으로 구성된 가족심사위원회의 면접을 또다시 통과해야만 한다. 이처럼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밀레그룹의 회장에 오른 인물은 능력과 인격적인 면에서 흠잡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차등의결권·재단 인정하는 스웨덴
스웨덴은 기업과 정부가 함께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에릭손과 일렉트로룩스, 사브(SAAB) 등의 기업을 보유한 스웨덴의 그룹 발렌베리(Wallenberg)의 정점에는 발렌베리 재단이 있다. 발렌베리 재단은 중간지주사인 인베스토르(Investor)와 팜(FAM)을, 인베스토르와 팜은 각각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이다. 창업주 일가도 개인지분은 없고, 재산이 보유한 지분을 통해 그룹을 총괄할 뿐이다.
금융기업을 축으로 한 발렌베리 가문이 1910년대 기업의 인수·합병에 나서자, 시민들은 ‘발렌베리를 해체하라’며 반발했다. 이에 2대 경영자는 1917년 현재 시가로 약 4조원에 이르는 전 재산으로 발렌베리 재단을 세워 사회공헌 활동에 나섬으로써 민심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동시에 스웨덴 정부는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해 발렌베리 가문이 재단의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 재단은 자회사들이 보내온 배당수익의 20%만을 계열사에 재투자할 뿐, 나머지는 전부 과학기술과 의료, 대학의 연구사업 등에 기부하고 있다.
이처럼 재단을 정점으로 하는 기업 지배구조는 미국의 포드, 덴마크의 칼스버그와 레고 등 선진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 국가는 차등의결권 제도의 결합을 통해 특정 가문을 대표하는 재단이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한국의 공익법인은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5% 이하를 출연 받을 때만 세금을 면제해주는 상속·증여세법으로 인해 재단을 정점으로 하는 기업 지배구조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다.